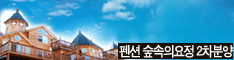|
|
|
|
|
|
|
|
|
|
| [단상] 전두환의 용치(勇治), 김대중의 덕치(德治) |
|
|
|||
|
|
막내아부지 l 2009.09.05 |
|
시골은 가을이 잘 익어 가겠구나. 망냉이 작은 아부지는 잘 있으니 아버지랑 웃집 작은 아버지 문안 자주 하렴. 항상 건강하고.. 가끔 안부하마! |
|
|
|
주봉리 l 2009.09.04 |
|
잘읽고 갑니다..좋은글많이써주세요 (주봉리 작은조카) |
|
|
|
양기용 기자 l 2009.08.26 |
|
과거든 현재든 경기 외적요인은 학자나 정부가 분석하고 방안을 내 놓을 일이지 기자 영역은 아니오. 기자는 그런 것이 제대로 적용되는가를 비평하는 입장이지요. 즉, 3저든 3고든 경기 좋고 나쁨을 내가 말할 필요는 없고 그 상황에서 정책이 올바른지, 바르게 집행되는지 검증해 노는 일이 나의 몫이란 얘기지요. 전두환 시절에는 분배가 잘 이뤄졌다는 것이 3저로 인한 경기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어느 시대나 당 정권으로 인해 망하는 기업, 흥하는 기업이 있었지 않나요? |
|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
|
뉴스소개
|
광고제휴
|
이메일구독
|
공지알림
|
개인정보보호
|
기사제보
신문등록: 서울 아00174호[2006.2.16, 발행일:2005.12.23]. 발행인·편집인: 양기용.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 49길 40. Tel: (02)433-4763. seoulpost@naver.com; seoulpostonline@kakao.com Copyright ⓒ2005 The Seoul Post. Some rights reserved. 청소년보호책임자: 양기용. 서울포스트 자체기사는 상업목적외에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