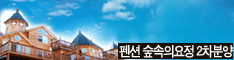인생은 어떻게 깊어가는가?
‘아버지, 우린 정말 대화가 없었지요? 다시 못 오실 당신께, 늦된 막내가 이야기 간추려 바칩니다.’
저자는 첫 산문집을 어머니에게, 두 번째 산문집을 아버지에게 바치고 있다.
평생 나눈 대화가 ‘원고지 다섯 장’을 넘지 않은 아버지,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손을 잡아드릴 수 없는 아버지에게 바치는 이 낱낱의 이야기들은 그러므로 ‘너’와 ‘나’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던 벽, 나이 들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멀리 떨어져 있던 타인과 그들의 삶을 내 삶 속으로 불러들여 손을 맞잡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2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나 가난한 섬마을에서 유년을 보낸 저자에게 고향은 때로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입을 덜기 위해 자식을 입양 보내던 그 시절, 고단한 노동으로 웃음을 잃은 아버지, 해산한 지 사흘도 못 돼 들에 나가 모를 내야 했던 어머니, 동생들을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누나들, 흰 실로 고무신을 꿰매 신고 마을 잔치나 제사 때 콩떡 한 줌 더 먹기 위해 앞다투던 친구들, 집집마다 간직한 아픈 사연들……. 궁핍한 가운데서도 막내로서 특권을 누린 저자는 이제서야 그들의 이름을 ‘꽃이름, 나무이름 물이름 산이름과 함께 하나하나’ 불러모은다.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 위에 포개놓을 때 인생은 그 무게로 기울고, 그 기울기로 인해 비로소 인생이 깊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가족, 이웃과 더불어 인생을 새롭게 긍정하다.
‘그동안 살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오해를 했을까요.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런 오해들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니 무섭습니다.’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하던 도서관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여학생이 실은 자기 뒤에 걸려 있던 그림, 헤어진 아버지를 닮은 그 그림을 보기 위한 것이었음이(<돌복숭아와 막대사탕>)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밝혀지듯, 친지의 묘를 이장할 때 보여준 고향 사람들의 야박함(<이장>)이 실은 자신을 위한 배려였듯, 인생에는 무수한 오해가 존재한다. 생의 오해들이 풀리고, 당시에는 그저 ‘작은 눈물의 씨앗’이던 것들이 시간이 흘러 인생의 ‘큰 행복’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맛’을 알게 되는 순간일 것이다.
이야기는 가족과 친구, 고향에 머물지 않는다. ‘안 듣는 척 남의 얘기 듣길 좋아하는’ 사람이 소설가이듯, 저자는 보고 듣고 체험한 이웃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현재를 비추는 거울로 세워놓는다. 자신의 삶의 근원이 되어주는 부모님, 형제들, 친지, 고향 사람들, 친구들, 자식, 이웃들은 삶을 통해 저자는 인생이 깊어가는 의미와 함께 진정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시던 어머니의 표정이 민들레처럼 평화로웠던 이유’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마냥 서글픈 일인 것만은’ 아닌 이유를 비로소 깨달으며 새롭게 생을 긍정한다.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