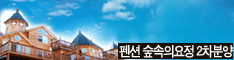[탐방] 조선국 마지막 고종,순종의 '홍릉,유릉' 과 단종 비 정순왕후의 '사릉'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
▲ 남양주 금곡에 있는 명성황후 와 고종의 '홍릉', 원후 순명황후 와 순종 과 계후 순정황후 의 '유릉'. 모두 단릉이며 합장릉이다. 또 남양주 진건에 있는 단종 의 비 정순왕후 의 '사릉' 탐방. 사진은 유릉 의 모습
ⓒ20140601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 홍릉,유릉을 홍유릉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즉, 선정릉이 아니라 선릉,정릉 또는 선·정릉. 헌인릉이 아니라 헌릉,인릉 또는 헌·인릉.. 으로 써야 맞다. 특히 원이 다른 태릉과 강릉은 태강릉 또는 태·강릉 이라고도 쓸 수 없다.
※ 국문법에서 'ㄹ,ㄴ,ㅇ'의 표기가 맘대로 변하는 두음법칙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태릉(泰陵)'보다 '태능', '사릉(思陵)'보다 '사능'의 - 현 국문법상 잘못된 표기가 훨씬 많은고로, 영어처럼 표기는 바르게, 발음을 유동적으로 해야한다. = 서울포스트 는 두음법칙을 무시하고 혼용하고 있음.
관악산 戀련주대↔연주대, 陵릉선↔능선, 魯로산대군↔노산군, 비률(比率)↔비율, 확율↔확률(確率), 률법(律法)↔법율, 안녕(안영安寧)↔영친(녕친寧親), 북한산 국녕사(국영사國寧寺)↔천태산 녕국사(영국사寧國寺), 양녕대군(讓寧大君↔효령대군(孝寧大君)...
※ 우리 문화재는 한국인 스스로 인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광화문과 남대문 복원이 엉망이니 문화재청이나 관련 당국이 얼마나 진창인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예, 경천사십층석탑 상륜부 사진 제시)
※ 왕의 비(계비 포함)에서 낳은 후손은 대군,공주, 궁에서 얻은 후손은 군,옹주 (예: 양녕대군,경혜공주, 광해군,덕혜옹주)
 |
| ▲ 국보 제86호 경천사 10층석탑. ① 일본으로 반출되기 전, 개성 경천사에 있던 모습 (탑 꼭대기 상륜부 '유'). ② 1960년 일본으로부터 회수하여 경복궁 뜰에 전시된 모습 (탑 꼭대기 상륜부 '유'). ③ 현재 중앙박물관에 이전,복원하여 전시중인 모습 (탑 꼭대기 상륜부 '무') ⓒ서울포스트 자료 |
모처럼의 휴일을 맞아, 남양주 금곡에 있는 조선의 마지막 왕인지 대한제국의 처음과 마지막 황제인지 (난 아직도 잘 모른) 고종,순종(高宗,純宗)의 '홍릉,유릉'(洪陵,裕陵 홍·유릉 洪·裕陵 사적 제207호)을 답사하고, 이어 근처 단종 의 비 정순왕후 릉인 '사릉(思陵)'까지 걸었다. 지역 이정표에 광해군묘도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너무 멀고.
 |
| ▲ 1915년 황실 가족사진. 고종의 둘째아들 의친왕의 열한번째 아들이자 '비둘기집'을 부른 가수 이석 씨가 2004년 4월 공개한 1915년 창덕궁 인정전에서 찍은 황실 가족사진 ⓒ자료 |
 |
| ▲ 미국의 동양학자 윌리엄 그리피스가 수집한 명성황후 장례식 사진 ⓒ자료 |
 |
| ▲ 1919년 3월 3일. 고종 장례행렬사진 ⓒ자료 |
 |
| ▲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행렬도. 이날 6.10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자료 |
 |
| ▲ 1966년 조선 마지막 순정황후의 장례행렬 ⓒ자료 |
 |
| ▲ 1950년 이후 미군과 민간인이 찾은 유릉 ⓒ자료 |
 |
| ▲ 1950년 이후 미군과 민간인이 찾은 유릉 ⓒ자료 |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틈 사이에서 조선을 마감하고 대한제국을 창업하여 황제에 오른 고종(광무 황제) 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이상으로 속을 썩었다.
드라마 정도전에서 조선 창업이 묘사되지만, 이성계의 절대 신임을 받은 정도전은 왕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려는 계획이 원자인 이방원에게 반감을 일으킴으로써 1,2차 왕자의 난 이후 살해된다. 아들의 행위에 치를 떤 이성계 가 왕위를 정종,태종(이방원)에 물려주고 함흥에 기거하게 된다.
고종도 민비와 갈등을 겪으며 정치적 모든 실권을 민씨 일가에 빼았겼다. 이후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1907년 왕위를 순종에 물려주고 덕수궁에 머물다가 1919년 1월21일 함녕전에서 승하한다. 유력한 원인은 친일세력에 의한 독살설. 이를 계기로 3.1독립운동이 일어났고, 3월 3일 남양주 금곡에 묘역을 조성, 청량리에 있는 있는 명성황후 홍릉을 천장하여 합장된다. (고종과 순종의 능호는 독자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먼저 묻힌 비의 릉명을 땄다.)
'홍릉,유릉(洪陵,裕陵)'은 1897년 연호를 광무, 왕을 황제 라 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한 후이므로 , 조선 26,27대 왕 고종,순종이 아니라 대한제국 1대,2대 고종황제,순종황제 라고 해야하며(역사가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명확히 해야할 대목), 왕릉이 아니라 황제릉이다. 두 릉은 명나라 황제릉을 모방했다. 때문에
조선왕릉에 있는 '정'자 각(정자각丁字閣) 대신 일자형 침전(寢殿)'을 세우고 능 주변에는 장명등과 망주석만 두었으며, 참도(參道) 양 옆으로 문인석,무인석(문석인,무석인), 기린·코끼리·사자·해태·낙타·말의 동물 석상을 차례로 배치했다.
석물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왕릉의 석호(石虎),석양(石羊) 대신 해태,말을 두었으며, 또 기린,코끼리,낙타 의 형상은 한반도 역사의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또 홍릉의 석물이 추상적,해학적이라면, 유릉의 석물은 사실적이고 진지한 모양을 하고 있다.
'사릉(思陵)은 단종(端宗) 비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宋氏)의 단릉. 애환를 간직한 어린 왕비여서 그런지 릉은 작지만 단아하며 정갈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 살 적은 단종과 혼인해 일년도 함께하지 못하고 왕이 영월로 유배될 때 청계천 영도교(永渡橋)에서 이별한 후, 18세 때 궁궐에서 쫒겨나와 17세 단종이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고 매일 정업원(지금의 청량리 청량사) 뒤 동망봉에 올라 영월쪽을 바라보고 슬퍼했다고 한다. 8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종을 그리워했다고하여 사릉(思陵)이라고 했다.
1521년(중종 16)에 안장된 현 능지는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 경기도 양주군의 시가(媤家) 묘역이다. (저 아래 사진 참조)
※ 홍릉
※ 유릉
※ 사릉
 |
 |
 |
 |
 |
 |
 |
 |
 |
※ 홍릉[洪陵] - 검색 등
사적 제207호 (1970년 05월 26일 지정), 조선시대 왕릉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141-1)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에 있는 조선 26대 왕 고종과 비 명성황후 민씨를 합장한 무덤.
조선 제26대 왕 고종(高宗 1852~1919, 재위 1863∼1907)과 비 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1851~1895)를 합장한 무덤. 순종과 순명효황후, 순정효황후의 무덤인 유릉(裕陵)과 함께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207호로 지정되었다.
1895년 10월 8일(음 8월 20일) 경복궁 곤녕전에서 시해된 명성황후는 1897년 11월 21일 서울 청량리에 묻혔다.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녕전에서 숨져 3월 4일 현 위치에 예장, 이후 청량리 명성황후의 홍릉을 이장하여어 고종의 능에 합장되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홍릉은 황제릉의 양식을 따라 명나라 태조의 효릉(孝陵)을 본떠 조성되었다. 꽃무늬를 새긴 12면의 병풍석으로 봉분을 둘렀으며, 봉분 밖으로 역시 꽃무늬를 새긴 12칸의 난간석을 설치하였다. 혼유석·망주석·사각 장명등의 석물을 배치하였고, 봉분 밖으로 3면의 나지막한 담을 둘렀다. 대부분의 조선 왕릉에 설치한 석양(石羊)과 석호(石虎)는 없다.
능이 조성된 언덕 아래쪽에는 정자각 대신 정면 5칸·측면 4칸의 일자형 침전(寢殿)을 세웠다. 침전 앞의 참도(參道) 양 옆으로 문인석·무인석과 기린·코끼리·사자·해태·낙타·말의 동물 석상을 차례로 배치하였으며, 장대한 크기의 문·무인석은 금관을 쓴 전통적 기법으로 조각되었다. 침전 외의 부속건축물로 비각·홍살문·수복방·재실 등이 있다.
유릉[裕陵]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에 있는 조선 27대 왕 순종과 비 순명효황후 민씨, 계비 순정효황후 윤씨를 합장한 무덤.
사적 제207호 (1970년 05월 26일 지정)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141-1)
조선 제27대 왕 순종(純宗 1874~1926, 재위 1907~1910)과 비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민씨(1872~1904), 계비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윤씨(1894~1966) 세 사람을 합장한 무덤이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무덤인 홍릉(洪陵)과 함께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207호로 지정되었다.
순명효황후는 순종이 즉위하기 전인 1904년(광무 8) 11월 5일 숨졌고, 이듬해 1월 4일 양주 용마산 아래 언덕(현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에 예장되었다. 1926년 4월 25일 순종이 세상을 떠나 그해 6월 11일 홍릉 왼쪽 산줄기 현 위치에 안장되면서 순명효황후를 이장하여 합장하였고, 1966년에는 순정효황후가 합장되었다.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릉인 유릉(裕陵)은 조선 왕릉 중에서 하나의 봉분에 세 명을 합장한 유일한 동봉삼실릉(同封三室陵)이다. 홍릉처럼 황제릉 양식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홍릉에 비해 능역 규모가 약간 작으나 석물은 훨씬 크고 정교하다. 봉분을 감싼 병풍석과 난간석에는 꽃무늬가 새겨졌으며, 혼유석·망주석·사각 장명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조선 왕릉에 설치된 석양(石羊)과 석호(石虎)는 없다.
능이 조성된 언덕 아래에는 정자각 대신 침전(寢殿)이 있고, 침전 앞 참도(參道) 양쪽에 문인석·무인석과 기린·코끼리·사자·해태·낙타·말 등 동물 석상이 차례로 배치되었다. 침전 외에 비각·홍살문·수복방·재실 등의 부속건축물이 있다.
사릉 [思陵]
조선 제6대왕 단종비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宋氏)의 능.
사적 제209호 (1970년 05월 26일 지정)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 65-1
조선 제6대 왕 단종(端宗 1441~1457, 재위 1452∼1455)의 부인 정순왕후(定順王后 1440~1521)의 무덤이다.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209호로 지정되었다. 정순왕후는 1521년(중종 16) 6월 4일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소생이 없어 단종의 누이인 경혜공주가 경기도 양주군의 시가(媤家) 묘역에 묘를 만들었다.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되었던 단종은 1691년(숙종 7) 노산대군(魯山大君)으로 추봉되었다가 1698년(숙종 24) 11월 단종으로 복위되었다. 이때 정순왕후도 복위되었으며, 무덤은 사릉(思陵)이라는 능호를 받았다.
사릉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봉분 앞에 상석 1좌, 상석 양측에 망주석 1쌍을 세웠다. 봉분 주위에 석양(石羊)·석호(石虎) 각 1쌍이 배치되어 있고, 그 바깥쪽으로 3면의 곡장(曲墻; 나지막한 담)이 둘러져 있다. 그 아랫단에는 문인석·석마(石馬) 각 1쌍 그리고 장명등이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65-1번지에 위치한다.
▲ 남양주 금곡에 있는 명성황후 와 고종의 '홍릉', 원후 순명황후 와 순종 과 계후 순정황후 의 '유릉'. 모두 단릉이며 합장릉이다. 또 남양주 진건에 있는 단종 의 비 정순왕후 의 '사릉' 탐방. 사진은 유릉 의 모습 ⓒ20140601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1915년 황실 가족사진. 고종의 둘째아들 의친왕의 열한번째 아들이자 '비둘기집'을 부른 가수 이석 씨가 2004년 4월 공개한 1915년 창덕궁 인정전에서 찍은 황실 가족사진. 왼쪽부터 의친왕, 순종 황제, 고종의 외동딸 덕혜옹주, 영친왕, 고종, 순종 비인 순정효황후 윤대비, 의친왕 비인 덕인당 김비, 의친왕의 큰아들 이건 ⓒ자료
▲ 1919년 3월 3일. 고종 장례행렬사진 ⓒ자료
▲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국장행렬도. 이날 6.10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자료
▲ 1966년 조선 마지막 순정황후의 장례행렬사진 ⓒ자료
▲ 1950년 이후 미군과 민간인이 찾은 유릉 ⓒ자료▲ ⓒ서울포스트
▲ 어정(御井 -우물터) ⓒ서울포스트
▲ 사릉 오른쪽에는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 시가(媤家) 묘역 ⓒ서울포스트
▲ 대부분의 조선왕릉은 소나무숲이 잘 보존돼 있다. ⓒ서울포스트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포털
다음 에 뉴스 송고)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























































![[미얀마는 스튜디오]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 나라 미얀마(2)](/paper/data/news/images/2014/06/1_S_1402058758.jpg)
![[포토] 국제도시 송도 꽃길 보러 오세요~!](/paper/data/news/images/2014/06/718_S_1401972125.jpg)
![[탐방] 대한제국 처음과 마지막 황제의 '홍릉,유릉' 과 단종 비 정순왕후의 '사릉'](/paper/data/news/images/2014/06/1_S_1401715067.jpg)
![[현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후보, "교육도 사람이 먼저다"](/paper/data/news/images/2014/06/1_S_1401627653.jpg)
![[포토] 고요한 아침의 한강, 뚝섬유원지,수영장 풍경](/paper/data/news/images/2014/05/1_S_14015798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