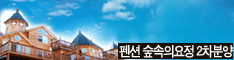[탐방] 남한강 정취와 어울어진 여주 신륵사(神勒寺)①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
▲ 안개 낀 남한강을 따라가다 신원역에서 잠시 하차. 저 물줄기도 여주의 여강(驪江)을 거쳤을 것이다.
ⓒ20130718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
| ▲ 용담대교를 거쳐 양수리,팔당으로 흘러간다. ⓒ서울포스트 |
내셔날지오그래픽 같은 탐사,탐방 매체가 무척 부럽다. 그래서인지 나에게 사물은 특정한 취향을 가리지 않고 신기함으로 다가온다. 산이 그렇고 강이 그래서 산에 가면 산과 어울어진 사찰, 강에 가면 강가의 돌과 풀섶에, 도심에서는 현대식 건축물법에, 시골에서는 민항아리나 풋풋함 베어 있는 채소에도 눈길이 머문다. 사태가 이 정도이니 내가 한 분야에 몰입해 문화유산답사기를 쓸 정도로 전문가가 될 수 없음도 잘 안다.
오늘 여주 신륵사로 떠난 건, 수 해 전 동료랑 가서 사진까지 열심히 찍어왔는데 자료가 정리돼 있지 않았다. 당시 바쁜 중에도 다른 일정들은 다 챙겼음에도. 해서, 며칠 전 북한강변과 수종사, 팔당댐를 거친 것이 끝내 남한강 신륵사까지 이어진 것이다.
서울에서 가난하기로 소문난 중랑구는 짬짬히 바람쐬러 다니기엔 최적지다. 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용마산,한강,팔당,청평,가평,춘천,남양주,양평,용문,양주,포천,동두천,연천 일대와 직통으로 연결돼,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매일 접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 곳.
상봉역에서 여주 신륵사 가는 길은 전철로 양평까지, 양평에서 여주터미널행을 타 신륵사 앞에서 내리면 된다.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근데 초행길에서 신원역 부근 남한강 사진을 찍고, 용문역으로 가 여주공용버스를 탄 것이 화근(?)이었다. 이 시골 버스 는 양평 내륙을 돌고돌아 제자리로 다시 온 느낌을 주었다. 기사에게 물으니 여주까지 가고있다고 한다.
중앙선의 곧 무너질 것 같은 구둔역(九屯驛, 폐역사로 2006년 근대문화재 제296호로 지정되었고, 멀리 새 구둔역이 따로 생겼다.)도 거쳤다. 제법 너른 개천이나 강을 지나고 안개속 고개를 넘었다. 세상에 오지도 그런 오지가 없다. 어떤 산을 한바퀴 돈 듯하더니 혼자 타고있는 구간도 있었다. 북내면에 도착해서야 왁짜지껄하다. 전부 여주읍내에서 통학한 학생들이다.
 |
| ▲ 중앙선 구둔역은 폐역사로 2006년 근대문화재 제296호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사진을 못찍어 자료(ⓒreidin999). 이곳과 고달사터는 새로운 탐방예정지 |
여주대교를 넘기 전 도자기단지에서 신륵사 들어가는 곳. 오늘은 전에 못 본 나옹화상의 부도탑을 볼려고 사찰 뒤 낮은 봉미산까지 올랐다. 칙칙한 습기와 땀이 온몸을 적신다.
7시, 경내에 퍼진 법고와 종소리.
그때서야 강월헌 에 앉아 물을 마시며 여유를 찾았다. 그리고 물안개 피어난 여강길을 따라 한강대교만큼 긴 여주대교를 터벅터벅. 터미널에서 양평가는 9시 30분 막차. 양평에서 11시 용산행 전철을 탔다.
오늘 코스 는 가면서도 꼬였지만, 오면서도 여주대교를 넘지 않아도 된 길이었다. 사실 둘 다 엄청난 시간을 소모했다. 그러나 인생이란 수행의 연속. 오늘 또 발견한 것은 어떤 길이든 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은 그런 곳에서 맞딱뜨려질 수 있다는 것.
간 길에서는 마을들의 정취를 담았고, 여학생이 버스에서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아름다운 모습, 폐허처럼 보이는 중앙선역사에서 우리 시골 가는 역 '사평역에서'라는 시도 떠 올랐다. 무엇보다 기쁜 건 '고달다지(高達寺址)'의 발견이다. 그간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고달사 터를 검색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고려시대 최대의 사찰이었다는 점과 최상급의 국가보물이 다수이고, 훼손되어 본체는 사라졌지만 불상받침이나 귀부,이수 등에서 지금까지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불교예술품이 있는 곳이다. 또 즐거운 탐방코스를 확보했다.
온 길에서는 터미널을 가르쳐줬던 아줌마가 앞서거니뒷서거니하며 따라왔다. 운동으로 강을 건넜다가 되돌아가는 모양이다. 말은 섞지 않았지만 가로등 아래 비친 긴 생머리, 좋은 인상에 나 혼자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여주(驪州)로 흐르는 남한강을 지역사람들은 예부터 여강(驪江)이라고 부른다. 그 강을 낀 신륵사는 현재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아도 국가 보물문화재 7점과 다수의 지방문화재를 소유한 절이다.
사찰내 강변 바위에 세워진 강월헌(江月軒, 나옹懶翁 의 또 다른 호)은 1972년 대홍수(이때 홍수로 북한산성내 행궁이나 산영루가 없어졌다니 엄청났던 모양)로 떠내려 가 다시 지은 전망소로 문화재는 아니다. 이 주변이 조선때 사대부들의 놀이터였다니 유교적 선비들의 불교비하가 만연한 사회였다. 조선때는 4대문 안에 승려 출입조차 금했으나 왕실의 비호를 받은 사찰도 있고 또 위기때마다 승병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봉미산 신륵사(鳳尾山 神勒寺: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282)는 명승 나옹선사 가 오면서 크게 번창했고 나옹화상도 여기서 입적(1376년)해 관련 유물들이 많다. 신륵(神勒)이라는 절 이름은 미륵(彌勒) 또는 왕사(王師) 나옹(懶翁)이 신기(神奇)한 굴레(륵勒)로 용마(龍馬)를 막았다는 전설과 고려 고종 때 건너편 마을에 나타난 용마가 걷잡을 수 없이 사나워 사람들이 잡을 수 없었는데, 이 때 인당대사(印塘大師)가 고삐(륵勒)를 신력(神力)으로 제압해 말이 순해졌다는 설이 있다. 여주의 '려(驪)'자는 '검은 말'이라는 뜻이다.
신륵사가 더 크게 번창한 것은, 광주의 대모산(大母山, 현 서울 내곡동)에 있던 영릉(英陵 : 세종의 능)이 여주로 이장된 1469년(예종 1)부터 왕실이 신륵사를 영릉의 원찰(願刹)로 삼아 1472년(성종 3) 대규모 중창불사를 해 200여 칸의 건물을 보수 또는 신축하면서다. 그 이듬해 대왕대비는 신륵사를 보은사(報恩寺)라고 개칭했다.
※ 나옹懶翁, 나옹선사禪師, 나옹화상和尙,나옹대화상大和商, 보제존자普濟尊者 나옹
나옹선사 는 고려 말의 명승으로 법명은 혜근(惠勤, 慧勤:1320∼1376), 호는 나옹(懶翁) 또는 강월헌(江月軒)이다. 속명은 아(牙)씨 원혜(元惠)로 경북 영덕군 영해(寧海)사람이다. 1344년(고려 충혜왕 5)에 회암사에서 수도하고, 1347년(충목왕 3)에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인도의 고승 지공선사(指空禪師)로부터 불법을 배우고 돌아왔다. 1358년(공민왕 7) 오대산 상두암(象頭庵)에 머물다가 1361년 공민왕에게 설법하고 신광사(新光寺) 주지가 되었다.
1365년(공민왕 14) 양주 회암사(檜巖寺,檜岩寺)의 주지가 된 이후 10여 년 동안 머물면서 사세(寺勢)를 크게 확장시켰다. 1376년(우왕 2), 여주 신륵사(神勒寺)에서 입적했는데, 승탑(僧塔, 浮屠 부도)은 그해 9월 그가 오래 머물렀던 회암사에도 세워졌다. 시호(諡號)는 선각(先覺).
보제존자 나옹은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을 통합하여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였던 승려로, 회암사의 주지로 있다가 왕의 명을 받아 밀양의 사찰로 가던 중 신륵사에서 57세로 입적했다. 동향인 목은 이색(牧隱 李穡)과도 각별한 친분이 있었다.
※ [그러나 또 다른 회암사 연혁(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에 의하면, 나옹이 회암사 중창에 맞춰 낙성식 전 문수회(文殊會)를 열었는데, (유생들에 천대받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다고 한다. 낙성식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우려에 성리학으로 무장된 사간들이 주동이 되어 나옹을 먼 곳으로 추방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201쪽) 이런 탄핵으로 나옹은 낙성식이 있은 1376년 4월 15일 이후 밀양의 영원사瑩原寺로 이주하게 되었다. 나옹은 영원사로 가는 중 낙성식이 있은 지 한 달만인 5월 15일 신륵사에서 입적하였다.
이런 갑작스런 나옹의 입적을 허흥식과 황인규는 독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두 차례 나옹을 죽였다고 나오는데 그때 쓴 단어가 ‘벨 주誅’이다. 즉 처단했다는 뜻이다. 이런 표현과 갑자기 급서했던 사실로 보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나옹의 죽음은 오히려 불교계를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옹이 죽자 많은 이적이 나타났다. 선각왕사비문에는 사리를 씻으려는 순간 구름이 없는 하늘에서 주변에만 비가 내린다든지, 사리가 155과 나왔는데 기도하니 558과로 늘어나는 등의 이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역대고승비문 고려편 4/361쪽) 이런 이적들로 나옹을 부처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런 이적으로 나옹현창운동이 일어나 입적한 신륵사뿐만 아니라 회암사, 안심사 등 여러 곳에 분사리되어 부도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정이나 의발 등을 모신 절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추가 내용은 회암사 제 4장인 석조유물 편 또는 나옹 현창운동에 대한 논문참조)]
[검색= 회암사에는 그런 의미에서 역대 왕을 제사 지냈던 곳이며, 이성계의 정신적인 은신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이곳에 머물렀음을 입증이라도 하듯 2000년 6월쯤 이성계와 무학대사 등의 호칭이 새겨진 대형 청동 풍탁(건물 추녀에 매달던 종)이 발견되었다. ‘왕사묘엄존자(王師妙嚴尊者)’, ‘조선국왕(朝鮮國王)’, ‘왕현비(王顯妃)’, ‘세자(世子)’라는 15자(字)가 새겨져 있어서 새삼 시공을 초월한 역사의 근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회암사는 성종 3년(1471) 세조비 정희왕후의 명으로 3년간에 걸쳐 중창하게 되었고, 명종 때 이르러 크게 중창하게 된다. 불심이 깊었던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은 허응당 보우대사 虛應堂 普雨大師 (고려말 원증국사 태고 보우 太古 普愚 와 구별)가 회암사를 중심으로 불교 중흥을 기도한 것이다. 낙성식을 겸한 무차대회를 열고(1565년 4월 5일) 그 이틀 뒤인 4월 7일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성균관 유생들로부터 ‘보우를 처형하라, 회암사를 불태워라’ 하는 상소가 올라오고 실록에는 “명종의 그 일을 걱정한다”라는 기록이 실려 있다. 초파일에 제주도로 유배된 보우대사는 제주목사 변협 에 의해 피살되고, 나옹화상 이후 200여 년간에 걸쳐 전국 제일의 도량이었던 회암사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어 불태워졌다. 회암사가 사라지면서 조선의 불교는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나 또다시 수난을 당하게 된다.
한편 회암사와 같은 폐사지로 이름난 곳은 경주의 황룡사지, 익산의 미륵사지, 원주의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그리고 여주의 고달사지 등이 있다.]
회암사는 장마전 양주로 일다니며 그 절(터)를 처음 알게 되었다. 도로변 안내판을 보고 꽤 유명한 사찰이었나보다,고 생각했는데 검색하면서 또 놀랐다. 한때 3,000여 명의 승려가 머물렀으나 지금은 폐사되고 그 아래 아주 작아진 절. 신륵사를 갔다와서 앞으로 1탐방지는 고려 최대의 사찰 여주 고달사지(高達寺址) 일대, 2탐방지는 조선 최대의 사찰 양주 회암사지(檜巖寺址, 회암사대檜岩寺垈)로 정했다.
깊이 반성해 본다면, 조선의 관념적 유교 때문에 한민족의 정신문화는 오히려 해체되었다. 서양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중국은 사원에서, 일본은 신사 가 무지한 민중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러나 조선은 서원이 역할을 했으나 선비 중심이었고 오히려 민중을 수탈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대원군의 서원철폐 이유). 민간정신문화의 집약처인 불교도량이 같은 백성인 유생들의 손에 의해 불살라 없어졌다니 억장이 무너진 심정이다.
이런 기반을 안 일본은 불교를 민간신앙으로 돌려주려고 장려했으나, 해방후 불교가 뿌리 내리기 전 타종교(기독교)가 급속이 민간을 파고 들었다. 그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하나, 계통적으로 보면 유교나 기독교나 비실용적 관념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의 찬란한 문화는 불교에 바탕이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가유형문화재는 불교가 꽃피웠을 때의 유물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최근 우리 문화재 관리 행태를 보면 분통이 터진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인지, 문화재를 격리·말살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그것이 종교적 가치관 때문이 아니길, 예배당 다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쿡!
※ 후기 : 강가의 절도 특별하지만 절 이름도 특이한 신륵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유래나 보물보다는 남한강이 주는 풍요로움, 강월헌 에 앉아 느끼는 유유한 정취일 것이다. 신륵사에서는 그냥 다 좋다는 표현이 맞다. 다만 몇 해 전 보았던 강 건너 하얀 은모래밭은 박박 긁어냈다고 한다. (龍)
석양의 고즈넉함에서 나옹 의 시 한 편.
靑山兮要我 - 청산은 나를 보고
-나옹선사 (懶翁禪師)
靑山兮要我以無語 (청산혜요아이무어)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蒼空兮要我以無垢 (창공혜요아이무구)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聊無愛而無憎兮 (료무애이무증혜)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如水如風而終我 (여수여풍이종아)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靑山兮要我以無語 (청산혜요아이무어)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蒼空兮要我以無垢 (창공혜요아이무구)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聊無怒而無惜兮 (료무노이무석혜)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如水如風而終我 (여수여풍이종아)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
| ▲ 수령 600여년 은행나무. 땅에서부터 세 줄기가 자라나 지금까지 두 줄기 생존 ⓒ서울포스트 |
 |
| ▲ 신륵사 경내 ⓒ서울포스트 |
 |
| ▲ 역시 수령 600여 년의 향나무 ⓒ서울포스트 |
 |
| ▲ 강월헌 과 삼층석탑. 이 자리에서 나옹선사의 다비식을 했다고 한다.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 ▲ 봉미산에서 본 경내 앞 남한강 ⓒ서울포스트 |
 |
| ▲ 일주문 ⓒ서울포스트 |
 |
| ▲ 물안개 낀 여강과 영월근린공원의 영월루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포털
다음 에 뉴스 송고)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



































![[포토] 연꽃 - 연화의 세계](/paper/data/news/images/2013/07/1_S_1374403154.jpg)
![[탐방] 남한강 가 문화재의 보고 여주 신륵사(神勒寺)②](/paper/data/news/images/2013/07/1_S_1381196034.jpg)
![[탐방] 여강 의 정취와 어울어진 여주 신륵사(神勒寺)①](/paper/data/news/images/2013/07/1_S_1381196010.jpg)
![[김윤성 - 나를찾아떠나는여행] 인도에서 시작된 기록](/paper/data/news/images/2013/07/1_S_1373977834.jpg)
![[탐방] 장마 1주일째, 수문 반쯤 연 팔당댐](/paper/data/news/images/2013/07/1_S_13738149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