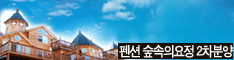[탐방] 탑골공원(원각사터) 과 보신각(종각터)
[探訪] 塔谷公園(塔谷公園 圓覺寺址) 과 普信閣(鐘閣址)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
| ▲ 원각사터에 있는 팔각정(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3호) ⓒ20130206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문화재관리 문제 : 과거 역사적 물상을 현재로 표기함에 있어 각종 표지 및 안내판에 우리말과 한자가 혼동스럽다. 이는 관리인식과 상태가 엉망이어서 통일성도 없음을 말해준다. 변별이 용이하게 바로 표기해야 한다. 즉, 많은 사람이 '원각사지'를 하나의 대명사로 착각하기가 쉽지 '원각사가 있던 터'로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보신각'은 과거 종각터였는데 보신각 현판은 달아 놓고 안내는 보신각터로, 부르기는 종각이라는 무개념의 극치를 보여준다.)
바로 고칠 예;
1. 원각사지,를 → 원각사터,로 (한문표기와 한글표기는 다르게)
2. 대원각사비,를 → 원각사비,로. (비문에 써진 접두사 '대'자는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원각사'의 존재감을 상실케 한다. 원각사였으므로 그냥 '원각사비'로 써야 함이 맞다.
3. 동대문으로 불리는 흥인문은 흥인지문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도 숭례문처럼 '흥인문'으로 고쳐야한다. (최초 흥인문에서 풍수상 흥인지문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4. '10'층석탑과 '십'층석탑 도 혼선을 부른다.
 |
| ▲ 작년 4월에 간 석굴암의 석굴(국보 제24호, 세계문화유산). 석가여래좌상을 가둬 놓고 사진도 촬영금지라고 한다. 후레쉬 터트렸다가 싫은 소리 들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서울포스트 |
문화재 관리는 더 한심스럽다.
의식도 없고 개념도 없는 계획설계, 개념없는 작업감독이나 개념없는 일꾼에게 맡길 일은 아니다. 보존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 모양인지 분통이 터진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보자.
1. 유리박스가 너무 작게 제작돼 탑 전체를 볼 수가 없다.
2. 탑 정면에 수직으로 유리 이음부분을 해놔 역시 탑 전모를 볼 수 없게 해 놨다.
(뒷면은 오히려 다 볼 수 있게 돼 설계부터 잘못한 것)
3. 투명무반사 재질이 있을텐데 빛에 반사되는 유리재질을 사용해야 했는가.
4. 관람객을 위해 투명 보호박스(현재는 유리)를 훨씬 더 크게 제작해도 되는데 스키니진 처럼 만든 이유는?
5. 완전 밀폐가 아닌 전면 정도는 개방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해도 사람과 동물의 침입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석굴암도 가둬 둔 것은 마찬가지. 작년 4월 찾은 석굴암은 오래전 봤던 것과 분위기가 달랐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관리를 강화한 면도 있겠지만, 침침한 공간속에 사진도 못찍게 모셔(?) 둔다는 것은 관리보존이 아니라 오히려 사장시킨 형태로 볼 수 있다. 나는 한국의 국보나 보물을 구경할 권리가 있으며 사진도 찍어 기록하고 홍보한 권리가 있는 한국인이다.
 |
| ▲ 3.1독립선언서 ⓒ서울포스트 |
 |
| ▲ 의암 손병희 선생상 ⓒ서울포스트 |
 |
| ▲ 보물 제3호인 '원각사비' ⓒ서울포스트 |
 |
| ▲ 원각사지 십층석탑(국보 제2호)도 원형을 볼 수 없도록 가둬놨다. ⓒ서울포스트 |
 |
| ▲ 정면 센터 수직으로 유리판 이음부가 설치 되었고... ⓒ서울포스트 |
 |
| ▲ 정면(남) ⓒ서울포스트 |
 |
| ▲ 보신각(종각터)-서울시 기념물 제10호 ⓒ서울포스트 |
 |
1. 탑골공원(팔각정) 과 원각사 (문화재청 자료 등 참고)
탑골공원과 탑골공원팔각정(塔골公園 八角亭)은 영국인 브라운이 건의하여 조성된 누정.
탑골공원 팔각정 자리에는 조선초기에 원각사(圓覺寺)가 있었다. 원각사는 고려 때 흥복사(興福寺)가 있었던 곳에 조선 세조 10년-1464년 5월에 창건 결정, 1467년 사월초파일에 10층석탑의 완공과 함께 낙성되었다. 연산군 10년(1504) 12월에 폐사(廢寺)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장악원(掌樂院)을 이 자리로 옮기고, 다시 연방원(聯芳院)으로 그 이름을 고쳐 기생방이 되었다.
연산군 후 한때 한성부의 관청으로 사용하기도 하다가, 중종 9년(1514)에 원각사의 재목으로 공공건물의 영선(營繕)에 쓰게 되어 그 자취가 완전히 없어졌고, 지금은 원각사탑과 비(碑)만 남아 있다.
탑골공원은 조선 말 고종 임금 당시에 총세무사(總稅務司)로 있던 영국인 브라운(John Mcleavy Brown, 栢卓安)이 1895년 경 이 곳을 도시공원으로 만들 것을 건의하여 만들어졌다. 이 공원은 원래 황실공원이었으며, 처음에는 탑이 있다 하여 탑골공원이라 하였고, 그 후에 파고다공원으로 불렸다가, 1991년부터 '탑골공원'으로 공식명칭이 되었다.
탑골공원 팔각정의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공원이 조성되고 1902년 고종 즉위 40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군악대의 연주 장소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 그때 건립되어 오늘날까지 남아 전하는 팔각정은 황실 관현악단이 쓰던 황실 음악 연주소였다. 당시 일요일에만 일반에게 공개되어 관현악을 듣고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는데, 1913년 7월부터 평일에도 개방했다.
팔각정과 탑골공원은 1919년 3월 1일 당시 청년학도와 애국시민이 이 곳에 모여 학생대표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시위 행진을 벌였던 3·1독립운동의 발상지다. 1969년 3월 발행 한국은행권 오십원 지폐 앞면에는 팔각정 모습이 국보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과 같이 그려져 있다
○ 탑골공원 내 4개의 문화재
탑골공원 : 사적 제354호(1991년 10월 25일 지정)
탑골공원 팔각정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3호(1989.09.11 지정)
원각사지 십층석탑 또는 10층석탑 : 국보 제2호
원각사지 원각사비 또는 대원각사비(大圓覺寺碑) : 보물 제3호
◎ 국보와 보물에 참고할 사항 추가
국보 제1호 : 서울숭례문(서울崇禮門) - 서울 중구 (남대문南大門)
국보 제2호 : 원각사지십층석탑(圓覺寺址十層石塔) - 서울 종로구
국보 제3호 :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 서울 종로구(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 관리)
국보 제4호 : 고달사지부도(高達寺址浮屠) : 주인공은 알 수 없음) - 경기 여주군
국보 제5호 : 법주사쌍사자석등(法住寺雙獅子石燈) - 충북 보은군
보물 제1호 : 서울흥인지문(서울興仁之門) - 서울 종로구 (동대문東大門)
보물 제2호 : 서울보신각종(서울普信閣鍾) - 서울 종로구(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 관리)
보물 제3호 : 대원각사비(大圓覺寺碑) - 서울 종로구
보물 제4호 : 중초사지당간지주(中初寺址幢竿支柱) -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보물 제6호 :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귀부및이수(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龜趺및이首) - 경기 여주군
[*보물 제5호는 지정등급이 변경되어서 영구 결호. 원래 보물 5호는 안양중초사지삼층석탑(中初寺址三層石塔)이었으나 문화재지정등급 재조정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4호(1997.12.26)로 재지정]
2. 원각사지 십층석탑(1465년)
국보 제2호
지정일 : 1962년 12월 20일
소장 : 탑골공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8
시대 : 조선
종류/분류 : 석탑
크기 높이 : 약 12m
원각사지 십층석탑(1465년)은 이 탑보다 약 120년 전에 만들어진 고려시대 경천사(敬天寺) 십층석탑(국보 제86호)을 모방(복제 수준)하여 만든 탑으로, '아(亞)' 자형의 3층 기단, 이와 같은 평면의 3층 탑신, 네모꼴로 된 4층 이상의 탑신이 경천사 십층석탑과 기본적으로 같다.
우리나라 석탑의 일반적 재료가 화강암인데 비해 (경천사 석탑과) 이 석탑은 전체를 대리석으로 건조하였고, 의장(意匠)이 풍부하여 조선시대 석탑으로는 최우수 걸작이라 하겠다.
탑신부는 층층이 아름다운 기와집을 모각하여 기둥·난간·공포(栱 包), 지붕의 기와골까지 섬세한 수법이다. 옥신(屋身)에는 수많은 부처 ·보살상 ·천인(天人) 등과 구름·용·사자·모란·연꽃·인물·새·선인(仙人) 등이 새겨져 있다. 조선시대 석탑으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조각솜씨를 보여주는 세련된 석탑이다.
1465년(세조11) 현재의 탑골공원 자리에 원각사가 세워졌으며 1467년(세조 13)에 십층석탑이 건조되었다. 현재 맨 위 3층짜리 옥개석(屋蓋石)은 오랫동안 무너져 내려져 있던 것을 1947년에 원상태로 복구하여 10층 옥개석까지 남아 있다. 그 위 상륜부(相輪部)는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른다.
◎ 자료 : ‘탑(塔)’은 ‘탑파(塔婆)’의 준말이다.
탑파는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스투파(率堵婆)라고 하는데, 이를 의역(意譯)하여 방분(方墳) 또는 고현처(高顯處)라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탑이라고 부르는데, 스투파는 고대 인도어인 범어(梵語, Sanskrit)의 stupa의 소리를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며, 탑파는 파리어(巴梨語, Pali)의 thupa를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다.
stupa는 신골(身骨)을 담고 토석(土石)을 쌓아 올린 불신골(佛身骨, 眞身舍利)을 봉안하는 묘(墓)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탑파란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축조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도(浮屠)’라고 하는 묘탑을 말하지만 커다란 탑이나 작은 부도는 같은 목적으로 쓰여 의미도 같다.
스리랑카에서 탑을 다가바(dagaba) 또는 다고바(dagoba)라 부르고 있는 것은 다투가르바(dhatugarba), 곧 ‘사리봉장(舍利奉藏)의 장소’라는 말을 약하여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현재 미안마(Myanmar)에서는 탑을 파고다(pagoda)라 부르고 있으며, 구미인(歐美人) 역시 파고다라고 부른다.
세간에서는 흔히 홀쭉한 고층건물을 탑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타워(tower) 같은 것이지 스투파는 아니다. 그러므로 사찰에 건립된 ‘탑’은 엄밀하게 말하여 ‘탑파’ 또는 ‘불탑’이라 표현해야 맞다. 이집트의 피라미드(pyramid)도 고대 왕묘의 한 형식이므로 탑에 해당된다.
3. 원각사지 대원각사비(大圓覺寺碑)
보물 제3호
기록유산 : 서각류/ 금석각류 / 비
수량 : 1기
지정일 : 1963.01.21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3
시대 : 조선시대
원각사의 창건 내력을 적은 비로, 조선 성종 2년(1471)에 건립되었다. 원각사는 탑골공원 자리에 있던 절로 조선시대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조계종의 본절로 세웠다. 조계종이 없어지자 관아로 사용되다가 세조가 간경도감에서『원각경 (圓覺經)』을 번역하고, 회암사 사리탑에서 사리를 나누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곳에 다시 원각사를 짓고 10층 사리탑을 세웠다.
비는 머릿돌을 따로 얹지 않고 비몸돌 위를 두 마리의 용이 감싸듯 표현되어 있어 복고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비를 지고 있는 돌거북은 둔중한 몸체로 머리는 목을 표현하지 않고 앞으로 나와 있다. 등무늬는 육각형이 아닌 사다리꼴 평행세선을 새겼으며, 등 중앙에는 연잎조각을, 꼬리와 다리에는 물고기 비늘을 조각해 놓아 조선시대 조각미의 독특한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비몸돌 위로는 보주(寶珠:연꽃봉오리모양의 장식)를 드는 두 마리의 용이 조각되었으며, 조각 아래의 가운데에는 '대원각사지비(大圓覺寺之碑)'라는 비의 이름이 강희맹의 글씨로 새겨져 있다. 비문은 당대 명신들이 짓고 썼는데, 앞면의 비문은 김수온, 성임, 뒷면의 추기는 서거정, 정난종이 각각 짓고 썼다.
4. 보신각
서울시 기념물 제1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45-5
옛 한양 운종가 동편의 종을 보호했던 누각이다. 조선 태조 4년(1395년)에 만들어진 건물은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으로 사라진 후 현대에 새롭게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개축되어 옛 모습은 남아 있지 않다.
1392년 조선 태조 이성계가 뜻을 세운 한양은 음양오행에 바탕을 둔 철저한 계획도시였다. 조선시대 한양(漢陽)에 종을 처음 건 것은 1398년(태조 7)으로, 광주(廣州)에서 주조한 종을 청운교(靑雲橋) 서쪽 종루에 걸었다. 1413년(태종 13)에 종루를 통운교(通雲橋:종로 네거리)로 옮긴 데서 종각이 유래하게 되었고, 파루(오전 4시)에 28번, 인정(오후 10시)에 33번 울리며 도성 4대문의 여닫는 시각을 알렸다.
유교사상을 국가경영의 기본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오행'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고 그중 '믿음(信)'을 중심으로 여겼다. 도성의 4대문에 한 글자씩 쓰인 네 가지 덕목들과 함께 그 중심에 '보신(普信)'을 고종이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고종 때 세상은 불신과 배신이 극에 달해 자신과 조선에 대재앙을 안겨 준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 다.
5. 서울보신각종(서울普信閣鐘)
지정번호 : 보물 제2호
지정연월일 : 1963년 1월 21일
시 대 : 조선 세조 14년(1468)
규모 : 총높이 3.18m, 입지름 2.28m, 무게 19.66t.
재료 : 청동
나돌고 있는 자료 전후를 살펴보니 세조는 대종을 두 개 만들었다. 세조 4년 1458년에 만든 종은 임진왜란때 종루와 종이 완전 소실되었다.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보신각종은 종의 몸체에 조선 세조 14년인 1468년에 만들어진 범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제작시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범종으로 보물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종은 처음 돈의문(敦義門 : 西大門) 안에 있는 신덕왕후정릉(神德王后貞陵)의 능사(陵寺)에 있었으나, 정릉사(貞陵寺)가 폐사되어 원각사(圓閣寺)로 옮겼으며, 다시 1536년(중종 31)에 남대문 안으로 옮겨놓았다가 1597년(선조 30) 명례동 고개로 옮겼던 것을 1619년(광해군 11)에 종각을 다시 짓고 종을 걸었다고 한다.
그후 조선 후기까지 4차례나 화재와 중건이 있다가 1895년(고종 32)에 종각에 '보신각(普信閣)'이란 현액(懸額)이 걸린 이후 종도 보신각종이라 부르게 되었다. 6·25전쟁으로 종각이 파손된 것을 1953년 중건하였다가 1980년 다시 2층 종루로 복원하였다. 당시의 보신각종은 그 수명이 다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지금의 종은 1986년 제작된 '서울대종'이다.
6. 경천사(敬天寺)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중련리 부소산(扶蘇山)에 있었던 절.
고려 시대의 사찰로서 예종 8년(1113)에 낙성되었다. 이 절에는 고려 역대 임금들의 기신도량(忌辰道場)이 많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13층 석탑이 유명하며 1348년에는 십층석탑(경천사지십층석탑)을 건립했다.
경천사(擎天寺)라고도 한다. 1118년 예종은 숙종의 기신도량(忌辰道場)을 이곳에서 베풀었고, 1134년 인종이 문경태후(文敬太后)의 추모제를 열었으며, 그 뒤 인종·의종·공민왕 등이 자주 행차하였다.
고려 말 13층석탑을 건립하였으며, 1393년 조선 태조가 신하들과 이 곳에서 천추절(千秋節)의 기념행사를 가졌다. 1394년 태조의 아버지인 환왕(桓王)의 추모제를 지내고, 특별히 재를 열고 화엄삼매참(華嚴三昧懺)을 강하였다. 1397년(태조 6)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추모제를 지내고 화엄법석(華嚴法席)을 열었다.
이 절의 10층탑은 1465년(세조 11)에 만든 원각사(圓覺寺)의 탑과 함께 이국적인 기법으로 만든 대표적인 것이다. 고려 공민왕 때 노국공주의 원탑으로 만들었다는 설과 1348년(충목왕 4) 건립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탑의 각 면마다 12회불상(十二會佛相)을 조각하였다.
7. 경천사 십층석탑(敬天寺十層石塔)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86호로 지정되었다. 높이는 13.5m이다. 개성직할시 개풍군 광수리 부소산 경천사터에 있던 것을 경복궁에 옮겨 세웠다. 한말에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 미쓰아키[田中光顯]가 불법으로 해체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반환되었으나 파손이 심하여 경복궁근정전 회랑에 방치되었다가 1959~1960년에 재건되었고, 다시 1995년 해체된 후 문화재연구소·한국자원연구소·원자력연구소의 공동작업으로 완벽 보존처리되었다. 2005년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개관하면서 다시 새롭게 전시되었다.
석탑의 형식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다각(多角) 석탑의 유형을 따르지 않고 신라의 형식을 이은 평면직사각형의 형태를 갖추었다. 기단의 평면은 '亞'형으로 3단이고, 탑신부는 1∼3층이 기단과 같은 평면이나, 4층부터는 직사각형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체감(遞減)되었다. 각 층마다 옥신(屋身) 밑에는 난간을 돌리고, 옥개(屋蓋) 밑에는 다포집 형식의 두공 형태를 모각(模刻)하였으며, 상면에는 팔작지붕 형태의 지붕 모양과 기왓골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부의 조각은 기단과 탑신에도 새겨져 있는데, 기단에는 부처·보살·인물·화초·용 등이, 옥신에는 13불회(佛會) 외에도 부처·보살·천부(天部) 등을 빈틈없이 조각하였다. 그 수법이 장려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우미한 풍취가 넘친다. 이러한 형태의 석탑은 조선 전기에도 나타나지만 유례 없는 희귀한 일품이다.
초층 옥신의 이맛돌에 새겨진 조탑명(造塔銘) "至正八年戊子三月日(지정팔년무자삼월일)"이란 기록에서 그 건립 연대가 1348년(충목왕 4)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복원 보존된 경천사십층석탑은 상륜부가 없다. 본래의 형태를 알 수 없어 박공 형태의 지붕만 복원했다고 한는데, 이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옛 자료와 경복궁터에 있을 때는 상륜부가 선명한데 말이다. (龍)
※ 자료와 이미지는 넷상에서 참고했으며 상업목적이 없습니다.
 |
| ⓒ1904년 원각사비 자료 |
 |
| ⓒ파고다공원 자료 |
 |
| ⓒ일제강점기 엽서 - 경성 파고다공원 자료 |
 |
| ⓒ원각사지 십층석탑 자료 |
 |
| ⓒ원각사지 십층석탑 자료 |
 |
| ⓒ원각사지 십층석탑 자료 |
 |
| ⓒ보신각종(국립중앙박물관 보관) |
 |
| ⓒ경천사 십층석탑 자료 |
 |
| ⓒ경천사 십층석탑 자료 |
 |
| ⓒ경천사 십층석탑(국립중앙박물관 보관) 자료. 2005년 중앙박물관에 '상륜부' 없이 복원했다. 과거 경복궁(중앙청)에서는 상륜부가 있었는데, 이걸 누가 어디다 치웠을까? |
[수집·정리·편집]=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










































![[탐사] 눈팅산행 - 도봉산과 북한산 뒤태 감상](/paper/data/news/images/2013/02/1_S_1360563869.JPG)
![[포토] 전남 담양 병풍산(屛風山)의 설경](/paper/data/news/images/2013/02/650_S_1360371294.jpg)
![[탐방] 탑골공원(원각사지) 과 보신각(종각지)](/paper/data/news/images/2013/02/1_S_1360553362.jpg)
![[단상] 애완동물, '개'와 '복어' 사이에서](/paper/data/news/images/2013/02/1_S_1360170683.jpg)
![[탐방] 눈 내린 광릉숲, 국립수목원 길](/paper/data/news/images/2013/02/1_S_136004288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