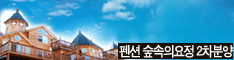[탐방] 전남 화순 - 화재로 잃은 보물 '쌍봉사(雙峰寺)'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군 제대하고서 한동안 고향땅 곳곳을 오토바이킹한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하니 전남 보성(全南 寶城)이라는 곳이 참 특별한 지형이라는 생각이다. 반도의 남서지방이지만 산악지대가 대부분이어서 분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앞에 봉화산이라는 것이 턱 버티고 있다. 그걸 넘으면 바다, 내륙과 바다의 경계가 봇재라는 안개다발지역으로 소풍 다녔던 보성녹차밭의 최적지다.
 |
| ⓒ 녹차밭 자료사진 |
장흥 접경에 '곰재-곰이 산다는 재, 웅치(熊峙)의 제암산(帝岩山 779m, 최정상 임금바위를 807m로 표기한 곳도 있다.)은 꽤 유명하고 거기서 섬진강이 발원한다. 그 개천과 강이 구비구비 돌아 겸백 저수지와 섬진강 상류 주암댐을 만든다. 득량의 칼바위산들은 상당한 악산이다. 바다는 장흥 안양에서부터 보성의 회천(율포, 천포), 예당 수문과 조성을 거쳐 고흥반도 대서까지 이어진다.
낚시대를 메고 보성강으로, 사냥을 하러 뒷산골로,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노닐던 기억들. 곡물, 야채, 민물고기, 바다고기, 육고기-가난이 아니라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다.
어릴적 동네 사람들과 어머니를 따라 새벽기차를 타고 예당 수문에 물맞으러 갔던 기억. 평야를 만들고자 일제때 간척사업으로 축조된 방조제 위를 끝없이 걸어 수문에 당도하면 짱뚱어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시 찾았던 그 곳은 허름한 횟집 몇 개, 수문은 온데간데 없었다. 성긴 눈발에 으악새만 부비던 곳에서 필름 카메라를 들이 댔던 시간들. (이 글에서는 이런 보성을 쓸려는 것이 아니고...)
당시 북쪽으로 재를 넘어 화순 이양을 돌아 온 적이 있다. 쌍봉사라는 표지를 따라 좁은 농로로 진입했는데 손질이 덜 돼 그냥 자연속에 방치된듯한 특이한 사찰이 보인다. 3층탑이 대웅전이라는 형태로 화엄사 대웅전을 연상했던 것과는 영 딴 판이었다.
(※ 사용된 이미지는 쌍봉사 사이트 및 검색에 의존했으며, 상업목적이 없음으로 저작권을 행사하실 분은 메모 남겨 주십시오. -편집자)
 |
| ⓒ쌍봉사 자료사진. 한 때 보물 제163호인 대웅전(1984년 화재 후 재건으로 보물 지위 잃음) |
 |
| ⓒ자료사진 |
 |
| ⓒ자료사진 |
나중에 알고보니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松廣寺)의 말사인 그 쌍봉사(雙峰寺)는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和順郡 梨陽面 甑里)에 있는 사찰로, 868년 신라 경문왕(景文王 8년) 때 도윤(道允)이 창건. 도윤이 자신의 도호(道號) '쌍봉'(雙峰)을 따 쌍봉사라 하고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사자산문(獅子山門)의 기초를 닦았단다.
그후 고려 시대인 1031년(문종 35) 혜조국사(慧照國師)가, 공민왕 때는 관찰사 김방(金倣)이 중건하였고, 임진왜란 때 폐사된 것을 1628년(인조 6년) 탑지(塔址) 위에 현재의 3층 대웅전을 중건한 것을 비롯, 1667년(현종 8)·1724년(경종 4)에 계속 중수하였다.
사찰 경내에는 국보 제57호인 쌍봉사 철감선사탑(澈鑒禪師塔), 보물 제163호인 쌍봉사 대웅전(1984년 화재 후 재건으로 보물 지위 잃음), 보물 제170호인 쌍봉사 철감선사탑비(澈鑒禪師塔碑)가 있다. 철감선사탑은 8각 원당형(圓堂形)에 속하는 신라시대 부도(浮屠)로, 그 시대의 부도 중 최대의 걸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대웅전은 평면이 네모 반듯한 3층 전각으로 목조탑파(木造塔婆)의 형식인 희귀한 건축물이다. 철감선사탑비는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만 남은 무신비(無身碑)이다.
쌍봉사는 1597년 정유재란 때 건물과 재산이 소실되었고 1950년 6·25 때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다. 극락전과 대웅전만이 보존되어 오다가 1984년 3층 목조탑 대웅전마저 소실되었다. 1986년 대웅전이 복원되고 해탈문·요사채·종각이 건립되었고 1997년에는 철감선사탑 탐방로 정비와 육화당 신축 공사가 있었다.
 |
| ⓒ자료사진 |
 |
| ⓒ자료사진 |
 |
| ⓒ자료사진 |
 |
| ⓒ자료사진 |
 |
| ⓒ자료사진 |
 |
| ⓒ자료사진 |
 |
| ⓒ자료사진 |
 |
| ⓒ자료사진 |
 |
| ⓒ자료사진, 국보 제57호인 쌍봉사 철감선사탑(澈鑒禪師塔) |
 |
| ⓒ자료사진, 보물 제170호인 쌍봉사 철감선사탑비(澈鑒禪師塔碑) |
 |
| ⓒ자료사진 |
 |
| ⓒ자료사진 |
쌍봉사(雙峰寺)에 관한 부연
도윤(道允, 798~868): 속성 박(朴). 호 쌍봉(雙峰). 시호 철감선사(徹鑒禪師). 탑호(塔號) 징소(澄昭). 한주(漢州:경기 廣州) 출생. 18세에 출가하여 귀신사(歸信寺)에서 《화엄경(華嚴經)》을 배웠으며, 825년(헌덕왕 17) 중국 당(唐)나라에 가서 보원(普願)에게서 심인(心印)을 배우고 그 법을 이었다. 847년(문성왕 9) 범일(梵日)과 함께 귀국하여 금강산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때 경문왕도 귀의(歸衣)시켰다고 전한다. 경문왕 8년(868) 71세로 이 절에서 입적하니, 왕은 '철감'이라는 시호를 내리어 탑과 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철감선사탑 - 국보 제57호
통일신라시대 석조부도(石造浮屠)의 기본 양식인 팔각 원당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각 부분의 조각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다. 세부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상은 장중하다. 부도 높이는 2.3m이고 국보 제 57호로 지정되어 있다. 탑은 전체가 8각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모습이며, 대부분 잘 남아 있으나 아쉽게도 꼭대기의 머리장식은 없어진 상태지만 당시에 만들어진 부도 가운데 최대의 걸작품이라 한다.
탑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기단(基壇)은 밑돌·가운데돌·윗돌의 세 부분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특히 밑돌과 윗돌의 장식이 눈에 띄게 화려하다. 2단으로 마련된 밑돌은 마치 여덟마리의 사자가 구름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저마다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시선은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흥미롭다. 윗돌 역시 2단으로 두어 아래에는 연꽃무늬를 두르고, 윗단에는 불교의 낙원에 산다는 극락조인 가릉빈가(伽陵頻迦)가 악기를 타는 모습을 도드라지게 새겨두었다.
철감선사탑비 - 보물 제170호
비신은 없어지고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만이 남아 있으나 전체적인 조형과 조각기법이 매우 뛰어나다. 청년거북처럼 매우 씩씩하고 기운찬 모습으로 거북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동감이 있다.
[수집·정리·편집]=
(양기용 기자)
[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


































![[포토뉴스] 나경원 의원, 중구 서울시민과 '2010 남산 해맞이'](/paper/data/news/images/2010/01/1_S_1262350868.jpg)
![[포토뉴스] 원희룡 의원, 중구 서울시민과 '2010 남산 해맞이'](/paper/data/news/images/2010/01/1_S_1262350461.jpg)
![[탐방] 전남 화순 - 화재로 잃은 보물 '쌍봉사(雙峰寺)'](/paper/data/news/images/2009/12/1_S_1262537280.jpg)
![[리라이트] 화양서원과 송시열, 선유계곡 박온섭 선생(2009/10/17)](/paper/data/news/images/2009/12/1_S_1262157946.jpg)
![[중구] 대외기관 평가 역대 최고 성적](/paper/data/news/images/2009/12/1_S_1262019471.jpg)